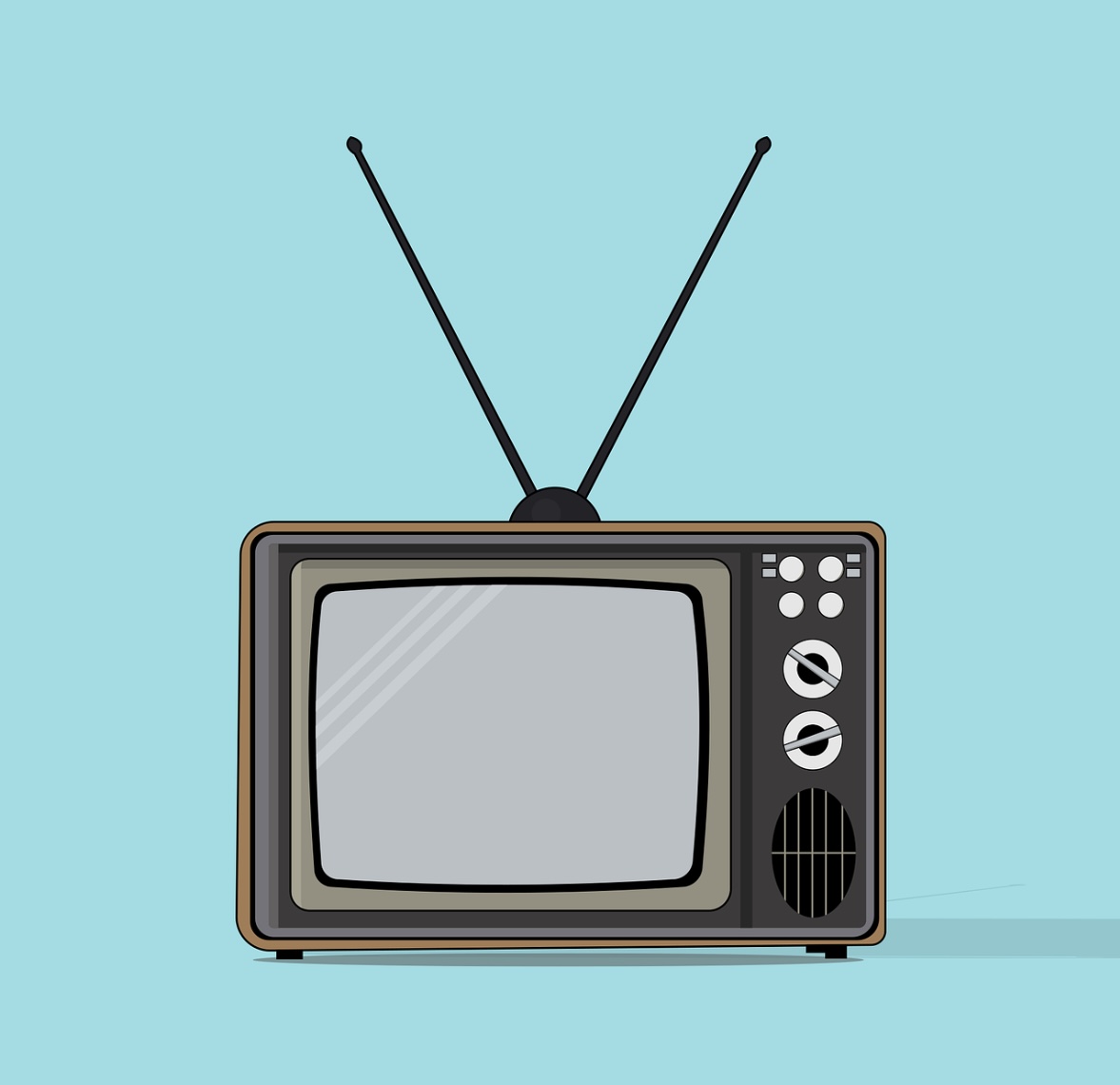
“TV 보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죠?”
“지금은 넷플릭스나 유튜브 시대인데, 구식 제도 아닌가요?”
놀랍게도 지금도 영국에서는 ‘TV세(License Fee)’라는 이름의 세금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공영방송 수신료가 아니라, 법적으로 의무 납부 대상인 세금이죠.
그렇다면 이 방송세는 왜 존재하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① TV를 보면 세금을 낸다고요? – 영국의 ‘라이선스 피’란
영국에서는 TV를 통해 방송을 시청하려면
BBC 라이선스 피(BBC Licence Fee)라는 이름의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요금이 아니라 법적으로 의무인 세금 성격의 제도입니다.
라이선스 피의 특징은 다음과 같아요:
• 텔레비전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거나
• BBC iPlayer를 통해 프로그램을 시청하면
→ 해당 가정은 연간 약 159파운드(한화 약 27만 원)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실시간 방송을 보기만 해도 납부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TV를 소유한 것이 아니라,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인 모든 가정이 납부 대상입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BBC 프로그램을 시청해도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매우 광범위한 징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② 왜 방송세를 걷는 걸까? – BBC의 존재 이유
BBC(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는
1922년에 설립된 세계 최초의 공영방송사입니다.
이 방송사는 정부가 아닌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되며,
정치·광고·자본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적 보도를 추구하는 것이 핵심 가치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영방송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라이선스 피’, 즉 방송세입니다.
영국은 BBC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가치를 지향합니다:
• 정치적 중립성 보장
• 상업광고 없는 순수한 콘텐츠 제공
• 소외 계층과 지방까지 아우르는 서비스
• 교육, 문화, 다큐멘터리, 어린이 프로그램 등의 공익 콘텐츠 생산
즉, 라이선스 피는 단순히 TV를 보기 위한 요금이 아니라,
공공재로서의 미디어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기여금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③ 논란도 많다 – 방송세, 공정한 제도일까?
물론 이 제도에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제기되는 비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싼 요금: 인터넷과 스트리밍 서비스의 급증 속에서
TV를 거의 보지 않는 가구도 동일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불만이 존재합니다.
• 시대착오적 방식: 실시간 방송 시청 기준은
온디맨드(VOD)와 넷플릭스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요.
• 징수 방식의 엄격함: 라이선스 피를 내지 않으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며,
실제로 벌금과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비판을 반영해, 일부 정치인들은
BBC 라이선스 피를 세금이 아닌 구독 기반의 요금제로 바꾸자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BBC 측은 여전히 국민 전체가 골고루 부담하는 방식이 공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죠.
④ 다른 나라도 있을까? – 한국과의 비교, 세계 방송세 제도
영국 외에도 방송세를 걷는 나라는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독일,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등이 있죠.
독일:
‘ARD ZDF Deutschlandradio Beitragsservice’라는 기관을 통해
모든 가구에서 월 약 18유로 정도를 납부합니다.
TV가 없어도, 정보 접근 가능성이 있다면 납부해야 하죠.
일본:
NHK 수신료가 존재하며,
TV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은 반드시 수신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거부할 경우 소송을 당하기도 해요.
대한민국:
한국에도 방송 수신료가 존재하지만,
TV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되어 자동 청구되는 형태(월 2,500원)로
영국처럼 강력한 법적 강제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죠.
이처럼, 방송세는 나라별로 방식은 다르지만
공공미디어에 대한 국민의 기여 방식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입니다.
마무리하며 – 방송세는 ‘미디어의 공공성’을 위한 사회적 선택
“TV를 본다고 왜 세금을 내야 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방송세는 단순한 요금이 아니라
공정하고 신뢰받는 언론을 위한 공동 투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상업광고 없는 뉴스, 교육용 콘텐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등은
시장 논리만으로는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그 빈자리를 메워주는 것이 바로 공영방송, 그리고 그 재원을 지탱하는 방송세입니다.
물론 시대 변화에 따라 제도의 개선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공공미디어의 존재 이유와 그 가치를 인정한다면,
방송세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좋은 사회를 위한 보험료’일지도 모릅니다.